예쁜 보라색 표지에 하얀 글씨로 새긴 책 <언어의 온도>는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는 부제를 깨알같이 달고 해맑은 얼굴로 독자를 맞는다. 아담한 크기의 책에 말(言), 글(文,) 행(行) 세 장으로 갈피를 잡고 88개의 작은 꼭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 지지 않는 꽃, 살아있다는 증거로 나눠 묶은 책이다. 자그마한 책자에 글을 쓰고 책을 만든다는 작가의 섬세함이 가득 배어 있다.
작가는 서문에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을 집어 든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 적당히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준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는다.
<언어의 온도>는 저자가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런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농밀하게 담아낸 책이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문장과 문장에 호흡을 불어넣으며 적당히 뜨거운 음식을 먹듯 찬찬히 곱씹어 읽다 보면, 각자의 '언어 온도'를 되짚어볼 수 있을지 모른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한다. 요즘처럼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당신의 말 온도가 몇 도냐'고 묻는 이 진중한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중순 해외여행이 가져다주는 설렘과 촉박하여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줄곧 옆구리에 끼고 다정한 벗 삼아 읽던 책이다. 여행용 크로스가방에 넣고 다니기에 알맞은 크기에, 내용도 간결하게 한 두 페이지로 엮어진 단문이라 커피를 홀짝이듯 한 꼭지 한 꼭지 음미하며 책장을 넘겼다.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 기내에서 졸다가 깨면 몇 꼭지를 삼키고, 영화를 보다가 재미없으면 책갈피를 더듬곤 했다.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밀라노로 넘어가는 긴 여정에서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국의 풍경과 함께 나를 편하게 했던 문장과 행들이 HB연필의 연한 라인 위에 살아있다.
책을 읽다가 밑줄을 쳤던 문장들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단어와 문장의 결이 달라진다. 한글 자모 24개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이론적으로 1만개가 넘는다. 정교하다고 해야 하나, 언어학적으로 활용성이 크다고 해야 하나, 한글은 아름답다. 그리고 섬세하다.
책 쓰기는 문장을 정제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른 아침 머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 깊은 밤 방 안에 홀로 일을 때 느낀 상념, 점심을 먹고 커피를 들이켜며 중얼거린 말에서 가치 없는 표현을 걸러낸 다음 중요한 고갱이를 문장으로 옮기고, 다시 발효와 숙성을 거쳐 조심스레 종이 위에 활자로 펼쳐놓는 일이 글쓰기라고 생각한다.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작가는 말한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고,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냥'이란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했어'에는 보고 싶어서, 사랑한다는 의미가 배어 있듯이,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정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부작용을 낳는다. 위로의 말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제한다. 단어와 문장을 분쇄기에 넣은 뒤 발효와 숙성을 거친 다음 입 밖으로 조심스레 꺼내는 느낌이다.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 위에 피는 꽃이다.
사람, 삶, 사랑, 이 세 단어는 서로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이 없는 듯하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 아닐까. 누군가 그리워하는 마음을 종이에 새기면 글이 되고, 그러한 심경을 선과 색으로 화폭에 옮기면 그림이 되는지도 모른다.
평생을 직장이라는 조직에 갇혀 상명하달식의 문화와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 익숙해져 획일화 된 사고체계가 은연중에 내 몸 안에 고착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기표현이 힘들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기름처럼 부유하며 이상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다.
말이나 글에도 품격이 있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눌변이나 달변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하는 말일 것이다. 좋은 글 또한 우리가 대했을 때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고성과 막말, 비난과 야유가 난무하고, 뜻을 알 수 없는 줄임말과 악성 댓글들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인간적이고 따뜻한 36.5도, 그 편안함에 몸을 맡기고 잠시 쉬어가고 싶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 그게 이 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특별함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따스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글을 통해 위로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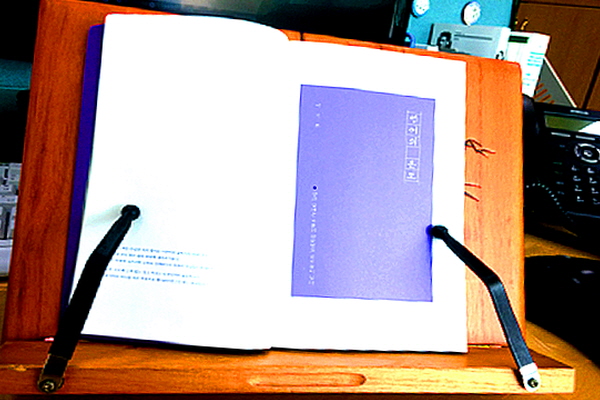
|
| ▲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보라색 표지에 단아하게 꾸며진 <언어의 온도>는 만든이의 정성이 느껴진다. |
| ⓒ 임경욱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