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지..."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 참 비참하다. 필자는 10여 년 전 어머니에 이어 한 해가 지나지 않아 아버지까지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 그뒤부터 살아계셨을 때보다 부모님을 덜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간혹 꿈속에라도 한 번쯤 오셔서 '재회'하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다.
설날이면 아버지·어머니 생각이 더욱 난다. 그래서 가족인가 보다. 이번 설에는 그동안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두 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지내야 할 것 같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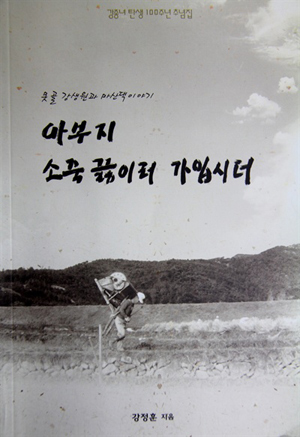
|
| ▲ <동아일보> 강정훈 기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사를 다룬 책 <강종녀 탄생 100주념 추념집, 못골 강생원과 마산댁 이야기-아부지 소죽 끓이러 가입시더>를 지난 1월 펴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며칠 전 읽은 책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이 든다. 한 쪽 한 쪽 넘길 때마다 꼭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 하는 말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만, 아련함만 쌓였다. 이게 다 책 <못골 강생원과 마산댁 이야기, 아부지 소죽 끓이러 가입시더> 때문이다.
'강종녀 탄생 100주년 추념집'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동아일보> 강정훈 기자가 아버지·어머니 자료를 모아 책으로 펴낸 것이다. 부모님 관련 자료를 모아 책까지 펴냈으니 역시 기자답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름을 크게 떨친 사람만 추념집을 내는 게 아니다. 촌부(村夫)의 일대기도 정리해놓고 보니 여느 인물보다 빛나 보인다.
가족 이름에 얽힌 이야기, 참 재미있네지은이는 탈곡기를 지고 가는 아버지를 표지 사진에 모셔놨다. 표지 설명을 보니 1980년대 중반이란다. 아버지라면 누구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지고 살고 그래서 자식들이 자라고, 그 자식이 배워서 또 그러면서 대물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책 속 아버지·어머니는 경남 사천 용현면 석계리 못골마을에 살았다. 1914년 태어나셨던 아버지 '강종녀'는 일본에서 대학 공부까지 마쳤고, 어머니는 마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인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강종녀를 '강생원'(姜生員)이라 불렀는데, 같은 마을 출신인 최진룡 경상대 교수가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일본어를 배웠다고 한다.
택호가 '마산댁'(宅)인 어머니는 여자로서 기골이 장대하고 성품 또한 남자들을 압도했다고 한다. 농사일도 곧 잘해 아버지와 아들이 일한 분량을 합쳐도 어머니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단다.
지은이는 편지·메모·주민등록증·도장·진찰권 등 아버지·어머니의 흔적들을 사진과 함께 책에 실어놨다. 그 흔적들은 빛바랬지만, 마치 지금도 곁에 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책 속의 사진과 글자 위에 내 부모님을 포개보니 기분이 묘하다.
강정훈 기자는 1993년 10월 부친상을 당하고 받은 조의금 가운데, 당시 13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다. 이 소식은 지역 일간지에 '온정'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책을 읽으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 '가족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바로 그것. 지은이는 청첩장에 썼던 이름을 거론해놨는데, 신랑의 아버지는 강종녀이고 어머니는 최성덕이다. 신부의 어머니는 강쌍감이다. 두 어머니 이름은 남자 분위기가 물씬 난다. 아버지가 되레 여성 분위기가 난다.
그런데 신부의 이름(덕녀)이 신랑 어머니의 끝자 '덕'와 아버지의 끝자 '녀'다. 아들(강정훈)은 "우연이지만 묘하다, 천생연분일까, 두고 볼 일이다, 이들 부부가 두 아들과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역시 부모님의 음덕 아닐까"라고 말했다.
"내가 내려가야 아들도 담배 피우지..."
큰사진보기

|
| ▲ 동아일보 강정훈 기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사를 다룬 책 <강종녀 탄생 100주념 추념집, 못골 강생원과 마산댁 이야기-아부지 소죽 끓이러 가입시더>를 최근에 펴냈다. 사진은 사천 용현면 석계리 못골마을에 있었던 집에서 1987년 타작을 하던 모습. |
| ⓒ 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옛날에도 누구네 할 것 없이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싸운 모양이다. 어머니는 누구 집 할 것 없이 잔소리를 많이 했던 모양이다.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했던가. 지은이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도 어머니와 가끔씩 다투십니까. 아니면 생전에 못했던 사랑을 한껏 나누고 계십니까. 솔직히 어린 아들은 '엄마와 아버지가 저렇게 매일 다투며 단 한 번도 함께 주무시는 모습을 못봤는데, 누나며 나는 어떻게 낳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무척 컸답니다."(본문 중에서)아들에게 아버지는 늘 어려운 분인가 보다. 지은이는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어머니만 참석했고, 중학교를 졸업해도, 고교에 입학을 해도 아버지는 늘 덤덤했다"라면서 "대학 입학 때도 별다른 축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이어 한 일화를 소개했다.
"아버지는 결혼할 무렵에야 아들을 조금씩 예우해줬다. 예우란 게 특별하진 않았다. 명절 날 큰 방에서 어머니, 자형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꽃을 피우다 일어서면서 '내가 아랫방에 내려가야 우리 정훈이도 담배 한 대 피우지…' 그런 정도였다. 그렇지만 아들 마음엔 그게 참 큰 배려로 느껴졌다."(본문 중에서)현실을 원망한 아버지, 화투패를 잡지 않았을까요즘 농촌사람들은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를 해 바쁘지만, 이전에는 농한기라는 게 있었다. 농한기뿐만 아니라 특히 마을에 초상이 나면 사람들은 모여서 화투를 쳤다. 그런 풍경이 이 책에도 담겨 있다.
"농한기만 되면 싫었던 일이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것이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했다. 동네 구멍가게가 주무대였다. 해질 무렵이면 어머니는 '질까(길가의 경상도 방언) 가서 네 아버지 보고 소 죽 끓이러 오라 해라'는 특명이었고, 아들은 소 도살장에 가듯 걸어서 질까로 갔다. 가게에 도착해도 선뜻 '아버지'라고 하지 못했다. … 아버지는 무섭고 높고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존재였다. … 서성대다 '아부지, 엄마가 쇠죽 끓이러 오시랍니다' 한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답변도 동일했다. '그래! 연방 갈게. 먼저 가거라'며 가끔씩 라면땅 한 봉지를 쥐어주셨다. 당시 라면땅은 최고의 과자였다."(본문 중에서)지은이는 "아버지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시간을 노름판에서 보냈다"라면서 "가슴에 남아 있는 응어리를 해소하려는 탈출구는 아니었을까? 한국전쟁 시기에 자신의 동생을 부역 혐의로 목숨을 잃은 뒤 혹시 현실을 원망하면서 화투패를 잡진 않았을까? 아마도 아버지에게 노름은, 자신의 반듯하지 못한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었지 싶다"라고 말했다.
책에는 여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애틋한 사연들이 담겨 있다. 강정훈 기자는 책에서 "그냥 작은 가족사라 생각한다, 사모곡·사부곡 성격이 크다"라면서 "훗날, 저 또는 제 아이들이 가족의 이야기를 묶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인사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잇는 아들과 딸들의 오늘은, 모두 인정 많고 자상하며 지혜로웠던 어머니 아버지의 공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삼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