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과학기술의 발전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며칠 전 초등학생인 아들 녀석이 생뚱맞게 던진 질문이다. 작년엔가는 어느 과학만화책에서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의 사례를 통해 어떤 과학기술인가보다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데, 요즘엔 과학기술이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는 반면, 다른 누구에게는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란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물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하던 일을 다 기계가 알아서 해주니 더 이상 사람들이 필요 없을 것 아니냐며 자기가 본 장면을 열거했다. 고속버스 승차권 파는 창구도 줄었고, 은행엘 가도 창구에 직원이 거의 없으며,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도 대부분 해고돼 이제 몇 분 안 계시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 그랬다. 교과서 등에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만, 따지고 보면 당장 미숙련 노동자의 퇴출로 귀결됐다. 발전된 과학기술이 실생활에 도입된 건 주로 단순노동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것보다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시대에 그들은 우리 사회의 '잉여'들이다. 과학기술을 앞세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죄'로 필경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복지'를 말하기에 앞서 '거지근성'을 우려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만 한다.
아이와 대화가 오가는 내내 불편했다. 그저 철부지의 엉뚱한 고민이라고 두루뭉수리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 '무심코 던진 돌멩이'는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운전대 위에 놓인 '하이패스' 단말기가 눈에 들어왔다.
하이패스 도입 후... 징수원은 어디로 갔나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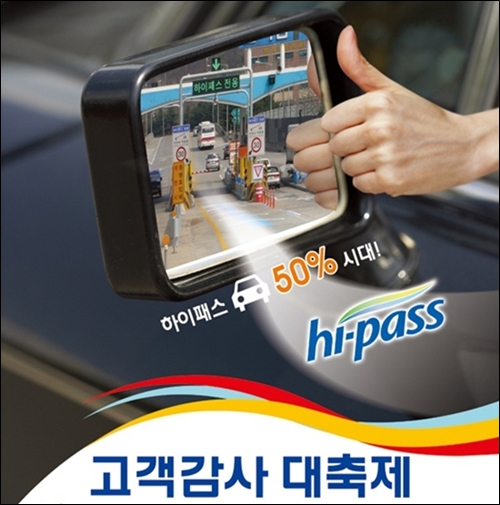
|
| ▲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 목표 달성으로 '고객감사 대축제' 행사까지 열었다. |
| ⓒ 하병주 | 관련사진보기 |
몇 해 전 사서 장착할 때만 해도 좋았다. 톨게이트를 쏜 살 같이 빠져나가며 옆 차선에 늘어 선 자동차들을 보며 쾌재를 불렀으니. 게다가 불과 몇 백 원 정도지만 통행료도 덤으로 할인 받았으니, 세상 참 좋아졌다고 손가락을 치켜세우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은 없어도 하이패스는 있다'고 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그러다 보니 톨게이트 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줄이 별반 차이가 없고, 통과 시간도 그 만큼 더 걸리게 됐다. 더욱이 통행량이 많지 않은 작은 톨게이트의 경우는 대개 겸용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하이패스가 사실상 달려 있으나 마나다.
결국, 대기 시간을 줄여 에너지 소비와 공해를 줄이고 원가를 절감한다는 '일석이조'의 하이패스의 장점이 거의 사라져가고 것이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어나고, 조금 과장하자면 차량 등록대수가 전체 인구수를 쫓아가는 현실에서 하이패스의 효용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하이패스가 보편화되면서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 또한 발생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무인화'에 단초를 제공하며, 실제로 수많은 요금 징수원들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그들의 회사가 전가의 보도처럼 되뇌는 '원가 절감'이란 '일자리 감축'과 동의어였던 셈이다. 요금 징수원들이 받았을 급여는 수많은 하이패스를 장착한 운전자들에게 쪼개져 '몇 백 원'씩 지급됐고, 정부는 경영의 모범 사례라며 회사를 치하했다.
순식간에 하이패스에게 일터를 빼앗긴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상심한 채 어디에선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선하다. 하이패스를 개발하고 제작한 업체가, 그리고 원가 절감으로 수익을 창출해낸 회사가 정부에 낸 '세금'이 쫓겨난 그들의 고된 삶을 지금 보듬어주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일터 빼앗는 기술 도입에 신중한 중국몇 해 전 중국을 여행했을 때의 일이다. 밀이 파도가 되어 넘실거리는, 마치 바다 같은 들판을 지나칠 때였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한 시간 넘게 '밀의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멀리에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흙바닥의 총총거리는 개미들처럼 움직이는 일군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농민들이었다.
족히 몇 백 명은 돼보였지만, 그들 주위엔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그 흔한 농기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여전히 곳곳에서 농기계 대신 손에 쥔 낫과 손수레로 그 넓은 들판의 곡식을 수확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활용하는 것보다 농민들의 품을 쓰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값싸고 풍부한 농민들의 노동력이 중국 경제성장의 밑바탕인 건 맞지만, 농기계가 보급되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될 테고 오래 전부터 그 땅에 터 잡고 살아온 농민들 대다수는 농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외려 더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결국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는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범죄, 교통 체증, 주택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악순환에 빠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익히 봐왔기 때문이란다. 아무리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빠른 속도로 세계화에 편입된다고 해도 중국의 뿌리는 농촌과 농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곧, 농민들의 일터를 빼앗아가는 기술이라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에서 그들은 여전히 대다수이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일진대 모름지기 정부의 정책, 심지어 과학기술조차도 그들을 우선 배려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색하게도 지금 중국은 '조화(和諧)사회'를 국정지표로 삼을 만큼 계층별, 지역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 문제의식만큼은 공감할 수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 해고...살기 좋아졌나요?
큰사진보기

|
| ▲ 쓰레기장을 정리하는 아파트 경비원. 머지 않아 경비원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
| ⓒ 김태헌 | 관련사진보기 |
우리 아파트에도 첨단 경비 시스템이 도입될 모양이다. 입구에 차단 막대가 설치돼 외부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계단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입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동선을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향후 세대별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나이 지긋한 경비원의 '눈' 대신 첨단 CCTV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관리비 절감'이란 곧, 경비원 해고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시스템이 설치되면 설명대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까도 의문이지만, 우선은 오며가며 인사를 나누고 친하게 지내던 경비원 아저씨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게 못내 서운하다.
입주민들은 대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식으로 호의적이다. 안전해지고 편리해진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지만, 정작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시스템이 설치되면 아파트 값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바람이고, 적어도 매달 관리비 몇 천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들 녀석도 섭섭한 눈치다. 쓰레기 분리수거 심부름을 할 때면 곁에 다가와 대견하다고 칭찬해주던 경비원 아저씨를 무척 따른다. 십시일반 기부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일하는 경비원 해고는 막아보자고 얘기라도 꺼낼라치면 개중엔 '경비원이 자가용을 끌고 다닌다'며 머쓱하게 만드는 이웃도 적지 않다.
아파트 경비원 자리조차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예전엔 60대 아저씨들도 많았지만, 요즘엔 50대도 나이든 축에 속한다. 게다가 무인 경비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에 밀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무얼 하며 먹고 살아야 하나. 무인 경비 시스템과 경비원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퇴근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 반갑게 맞아줄 '사람'은 사라진 채 CCTV와 눈인사를 나누고 삭막한 기계음만 들리는 아파트로 어쨌든 변모해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며가며 마주치는 경비원 아저씨를 정다운 '이웃'으로 보지 않고, 절감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요즘 세태가 무섭다.
분리수거 심부름 갔다가 경비원 아저씨에게 찾아가 버릇없이 '시스템 들어오면, 아저씨, 잘릴지도 모른데요'라며 말을 건넸다는 아들 녀석. 그의 생뚱맞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아직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