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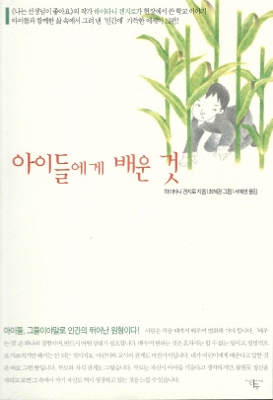
|
| ▲ 하이타니 겐지로 글, 서혜영 옮김, 《아이들에게 배운 것》, 다우, 2003 |
| ⓒ 다우 | 관련사진보기 |
하이타니 겐지로(1934∼2006)가 쓴 책 <아이들에게 배운 것>(서혜영 옮김, 다우)이 있다. 이 책은 그가 일본방송협회(NHK)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간대학' 교양 강좌에 나가 두 달 동안 했던 강의를 글로 정리한 것이다. 글이 말하듯이 되어 있어 쉽고 편하게 읽힌다.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다. 이 책에 일본 초등학교 1학년 사쿠다 미호가 쓴 시'개'가 있다. 단 석 줄로 된 시다.
개는
나쁜
눈빛은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어린이 시나 어른이 쓴 시에서도 '개의 눈빛'을 노래한 시는 본 적이 없다. 더구나 그 개 눈빛의 선함을, 그 개 눈빛이 '나쁜 눈빛'이 아니라고 말하는 구절도 없었던 것 같다. 이 시를 놓고 겐지로는 이렇게 말한다.
매우 엄격하지요? 사물을 보는 눈이. '그것은 왜 그럴까.' 하고 묻는 아이들의 마음은, 다른 이의 영혼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본래, 또는 처음부터 타인에 대한 호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일까,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 묻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이에, 자기 안에 타인에 대한 호의를 형성해 갑니다.
큰사진보기

|
| ▲ 하이타니 겐지로 쓰고 엮음, 안미연 옮김, 《태양이 뀐 방귀》, 양철북, 2016 이 책에 추천글을 쓴 강원도 속초 상평초등학교 탁동철 선생님은 하이타니 겐지로를 이렇게 소개한다. “그는 아이를 낮추어 보거나 귀엽게 보고 있지 않다.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며, 아이의 발견 덕분에 하루를 살겠다는 듯 기뻐하고 손뼉치고 있다.” |
| ⓒ 양철북 | 관련사진보기 |
직관은 아이들 시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 나는 겐지로의 이런 평가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겐지로는 아이들 글을 아주 '엄격하게' 보는 작가인데, 그는 여기서 '생활행동시' 이론으로 미호의 시를 보고 있다. 생활행동시는 일본 어린이 시 역사에서, 1920년대 일본 초기 어린이 시의 하이쿠적 관조를 극복하려는 글쓰기 운동이고, 말 그대로 생각과 몸의 '행동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를 말한다.
하이쿠는 5·7·5조 17자로 된 일본의 한 줄 시다. 사쿠다 미호의 시도, "개는 나쁜 눈빛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줄로 늘어놓으면 영락없이 하이쿠다. 겐지로가 "그것은 왜일까,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 묻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이에" 하고 말하는 것은 사쿠다 미호의 '행동'을 말한다. 그들이, 특히 교육운동에 뛰어들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글쓰기에서 행동성을 강조한 것은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다. 일본 생활글쓰기 운동에서 하이쿠적 관조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군국주의 망령을 끝내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하지만 이 시는 그들이 경계했던 '하이쿠적 관조'라기보다는 '하이쿠적 직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호는 개의 눈빛을 보면서 그 눈빛 자체의 선함을 보고 있다. 미호는 '묻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과정을 거쳐 개 눈의 선함을 본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타인에 대한 호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뛰어넘는다. 논리를 넘어 단숨에 본질에 다다르는 것이다. 직관의 힘이다. 직관은 아이들 시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아이들은 솔직하게 쓴다'는 말의 본뜻 한편 이 시는 <태양이 뀐 방귀>(양철북, 2016)에도 실려 있다. 그런데 한 군데 다른 곳이 있다. <아이들에게 배운 것>을 우리말로 옮긴 서혜영은 "개는 나쁜 눈빛은 하지 않는다"로 했는데, <태양이 뀐 방귀>를 옮긴 안미연은 "개는 나쁜 눈빛을 하지 않는다"로 했다. 물론 안미연도 '눈빛은'으로 옮겼는데 편집자가 교정을 보면서 '눈빛을'으로 바꿨을 수 있다. 원문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여섯 살 사쿠다 미호는 '눈빛은'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쓸 때가 많다.
<태양이 뀐 방귀>에서 하이타니 겐지로는 이 시를 놓고, 그 아래에 간단한 평을 붙인다.
이 시를 읽었을 때, 나는 마음 한가운데가 찡해서 잠시 말을 잊었어요. 얼마나 멋진 시인가요. 나는 가만히 일어나 거울에 내 눈을 비춰 보았어요. 나도 가만히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다. 거울 속 내 눈은 맑지도 깊지도 않았다. 아이들 글을 말할 때, 흔히 아이들은 글을 쓸 때 솔직하게 쓴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솔직하게 쓴다'는 말을 너무 쉽게, 또 단순하게 알고 있지 않나 싶다. 하이타니 겐지로는 <태양이 뀐 방귀> 뒤편에 어른들에게 쓴 글(〈내 스승은 아이들이었다〉)을 따로 붙이는데, 그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
아이들은 시를 쓸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줘야지,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지,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지 않는다. 기쁘고, 화나고, 좋아하고, 즐거운 것을 그때그때 열심히 쓸 뿐이다. 다른 이를 의식하지 않는데 사람의 혼을 흔든다. 나는 아이들의 이런 창작력이 부럽다. (……) 아이는 스승이고 은인이라는 말은 아이를 칭찬하려는 말이 아니다. 아이를 칭찬하려는 것이라면 실례다. 아이들 글이 '솔직하다'는 것은, 아이들은 시를 쓸 적에 처음부터 잘 써보겠다든지, 잘 써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겠다든지 하는, 그런 '계산'을 먼저 하고 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글은 뭔가 어색하고 티가 나기 마련이다. 하이타니 겐지로의 말처럼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움직이려고) 쓰지 않는다. 이 점이 어른들이 쓰는 글과 갈리는 지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은 솔직하게 쓴다'는 말의 본뜻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이 뀐 방귀>에 실린 어린이 시 몇 편을 아래에 들어 본다.
옥상에서
- 오가와 쇼코(일곱 살)
산이
나보다 작아서
나는
큰 남자 같습니다
선생님
- 이이오 즈타(여섯 살)
우리 선생님은
철봉을 열 번 시킵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안 합니다
할머니
- 오가와 고이치(일곱 살)
우리 할머니 이는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한다
이를 빼고 웃으면
개구리가 우는 것처럼
개개개개 웃는다
나도 지지 않고
하하하하 웃었다
구름
- 즈네마츠 마사유키(여섯 살)
하얀 구름이
검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어부바해 주는 걸까?
엄마
- 다다 도모코(여섯 살)
엄마가
생선을 구울 때
엄마와 생선이
눈싸움을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광주드림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