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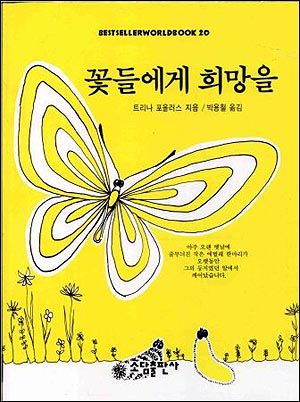 | | | ▲ <꽃들에게 희망을> | | | 삶의 전환은 어느 날 급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듯 서서히 다가올 때도 있다.
변하지 않는 듯 서서히 변하지만 어느 날 돌아 보면 그 이전의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된 나를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책 <꽃들에게 희망을>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고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어느 날 갑자기 혁명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진정한 혁명이란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일까?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큰 형님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형님이 자취를 하던 종암동 어느 골목에 있는 작은 집에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김치와 찬거리를 힘에 부칠 정도로 들고 찾았다.
서울 변두리였던 거여동에서 경동시장까지 가서 종암동으로 가는 버스를 다시 갈아타고 찾아간 형님의 자취방은 참 좁았다.
단칸방은 책상과 책꽂이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만을 허락했다.
전화도 귀하던 때라 오늘 온다고 기별을 했으니 직장 끝나는 대로 오겠지 생각하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주인집으로 전화가 왔다.
"오늘 조금 늦는데 기다릴 수 있니?"
"응, 알았어."
"책꽂이에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꺼내서 보면서 기다려라."
집에서 함께 생활할 때 형님은 공부를 가르쳐 줄 때에는 좀 엄하게 가르쳤다.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돌아온 형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검사를 할 것만 같았다. 낯선 동네요, 지금처럼 오락실이나 PC방이 있는 것도 아니니 별다르게 할 일도 없어서 책꽂이에서 그 책을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책을 찾아 들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어,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이건 만화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책도 아니네. 그런데 왜 형이 이런 책을 읽는 거야?'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동안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고정 관념을 흔들어 버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냥 작은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커다란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줄무늬 애벌레를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와 닿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골 촌놈에게 애벌레가 자라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뭐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라고….
"형, 책 다 읽었어. 그런데 형이 그런 책을 읽어?"
"그런 책이라니?"
"만화책도 아니고 아이들 동화 같은데."
"아직 넌 그 책을 읽지 않았구나."
"읽었는데."
"아직 못 읽은 거야. 이 책 너 줄 테니까 몇 번 읽어 봐라. 와 닿는 게 있을 거야. 이건 그냥 술술 읽어 가는 책이 아니야."
그저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애벌레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던 책을 받아든 나는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다시 읽었다. 그리고 '기둥' '나비'가 의미하는 바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천천히 내 삶을 변화시켜 갔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의 화두가 되어 있다.
지금의 언어로 당시의 깨달음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었다.
남들이 간다고 무작정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일인지 항상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내 안에 들어있는 나비, 나의 존재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존재 역시도 소중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과 삶의 현실이라는 경계 선상에서 늘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너도 나도 오르는 그 '기둥'에 대한 미련, 아무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기둥말고 수없이 많은 기둥이 있더라도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들은 젊은 시절의 나를 괴롭혔다. '아무 것이 없다고 해도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것이었다.
사춘기 시절 줄무늬애벌레 같은 나는 사랑하던 여자 친구가 노랑애벌레가 되길 바라면서 손때 묻은 그 책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책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었고, 그것으로 첫사랑도 막을 내렸다.
정상, 중심부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30대에 자그마한 책에서 다시 들려온 소리가 있었다.
"어,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꼭대기에서 들려온 소리는 충격이었다. 한 번 뿐인 삶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았다. 그러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자. 내 안에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만들어 가는 일이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어젯밤에는 애벌레를 좋아하는 6살짜리 막내아들에게 이 책을 읽어 주었다. 여느 동화책을 읽어 줄 때에는 금방 잠들던 녀석이 끝까지 다 읽고 잠을 청한다. 재미있단다. 막내는 훗날 이 책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
|
꽃들에게 희망을 (반양장)
트리나 폴러스 지음, 김석희 옮김, 시공주니어(2017)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