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딜리아니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 매료된 시인 한 명을 알고 있다. 해사한 얼굴에 말수가 적은 사내. 10여 년 전 '편지 쓰는 작가들의 모임'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기자는 먼 세월을 소급해 두 명의 시인을 떠올렸다.
고교 시절엔 또래 숙명여고보 여학생들의 마음을 흔들던 미소년에서 카프(KAPF·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 소장파의 좌장으로 존재를 전이한 임화. 그는 시적 재능을 이념에 빼앗기고 타향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사람이다.
그리고, 박인환. 낭만과 우울 사이를 무시로 오가며 서른한 살에 요절한 그는 제스처로서의 시가 아닌 온몸으로 밀어가는 시학(詩學)을 위해 청춘을 소신공양했고, 그것이 이른 죽음을 불렀다.
임화와 박인환을 닮은 시인, 그가 내놓은 새로운 노래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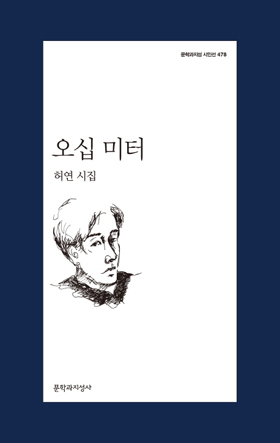
|
| ▲ 빛의 반대편 어두움과 희망 내부에 웅크린 우울을 노래해온 허연 시인의 신작 <오십 미터>. |
| ⓒ 문학과지성사 |
관련사진보기 |
외모는 물론, 풍기는 '작가적 향취'까지 임화와 박인환을 닮은 시인이 바로 허연(50)이다. 전작 <불온한 검은 피> <나쁜 소년이 서 있다> <내가 원하는 천사>를 통해 빛이 아닌 그림자, 열락이 아닌 침잠, 희망의 배후에 자리한 어두움을 노래해온 그가 새로운 작품을 챙겨 들고 독자들 앞에 섰다. 신작 <오십 미터>(문학과지성사).
시를 쓰기 시작한 20대 중반부터 허연이 주목한 것은 '즐거움의 파편'이 아닌 인간의 삶 내·외부에 자리한 외로움과 고뇌였다. 지천명에 이른 그는 태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두움을 '죽음'이란 단어를 향해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 예컨대 이런 시다.
'죽은 이의 이름을 휴대폰 주소록에서 읽는다. 나는 그를 알 수가 없다. 죽음은 아무에게도 없는 어떤 것이니까. 신전의 묘비를 읽도록 허락된 자는 아무도 없으므로.'- 위의 책 중 'Nile 407' 중 일부현대를 숨쉬는 '산 자'들의 영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에서 그 옛날부터 거부할 수 없는 주문처럼 지속돼 온 '죽음'의 그림자를 읽어내는 그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을까? 당연지사 없다. 이른바 '한국의 주요일간지' 문화부장이란 직책이 주는 안락함과 안정도 '시인' 허연에겐 훈장이 아닌 일상이다. 그러니, 그는 다시 이렇게 노래한다.
'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축복이 있다고 들었지만, 내게 그런 축복은 없었다. 불행하게도 오십 미터도 못 가서 죄책감으로 남은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무슨 수로 그리움을 털겠는가.' - 위의 책 중 '오십 미터' 중 일부지상에서의 서러움을 넘어서려는 시어... 투명한 죽음 곁으로살아간다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시인이 될 수 없다. 인간과 세계를 향해 뻗은 촉수에 슬픔이 묻어나오지 않는 이들을 '시인'이라 칭했던 역사는 없다. 인류가 지구에서 그 삶을 영위해온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가닿을 수 없는 미지의 그리움이 시인을 존재케 했다. 허연은 그걸 아는 사람이다. 허니, 시인인 그가 차안(此岸)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
그 숫자는 적지만 한국의 '좋은 시인' 대부분은 현세에서의 욕망을 눈 아래 둘 수밖에 없다. 허연 역시 그렇다. 그렇다면 그는 지리멸렬한 차안에서 '빛나는 피안(彼岸)'을 향한 시의 촉수를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아래 인용하는 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읽힌다.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옆집으로 이사 가듯 죽었다해가 길어졌고깨어진 기왓장 틈새로마지막 햇살이 잔인하게 빛났다구원을 위해 몰려왔던 자들은짐을 벗지 못한 채다시 산을 내려간다- 위의 책 중 '사십구재' 중 일부앞서 기자는 임화와 박인환이 그들의 곁에 두고 사랑했던(?) 죽음을 이야기했다. 보통의 사람들에겐 '존재의 절멸'에 다름 아닌 죽음. 그러나, 시인은 그 죽음조차도 삶의 일부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시인이 마주한 죽음은 슬픔이나 통곡이 아닌 말갛고 투명한 시적 재료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다.
이야기가 길어졌다. 겨울의 끝자락에 매달렸던 지난 주말. 바닷가 조그만 마을에서 허연의 <오십 미터>를 읽던 밤들은 행복했다. 세상 모두가 드러나는 아픔만을 앓는 2016년에 '드러나지 않고 잠복한' 세계와 인간의 상처를 아파하는 그의 시는 단연 돌올하다. 그것이 어둡고 습한 단어 '죽음'에 닿아있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된 해석이 평론가의 몫이라면 오독(誤讀)은 독자의 권리다. 걸어간 길을 닮고 싶은 선배 시인의 책에 관한 후배 시인의 오독이라면 허연은 이 또한 웃으며 안아줄 수 있으리라. 그 믿음이 이런 오만을 발동하게 한다.
아래는, 허연의 신작 시집 <오십 미터> 중 가장 빛나는 절창이다. 이 선택이 기자 하나만의 '오독'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라 한들 또 어떻겠는가. 봄이 오고 있다. 허연의 시는 진창 속에서도 환한 봄을 부르는 아픈 몸부림이다. 때론, 필연적인 삶보다 우연한 죽음이 아름답다. 목련은 죽기 위해서 산다. 인간도 다르지 않다.
피 묻은 목도리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다 흰머리 몇 개 자라났고 숙취는 더 힘겨워졌습니다. 덜컥 봄이 왔고 목련이 피었습니다.그대가 검은 물속에 잠겼는지, 지층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꿈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억은 어디서든 터를 잡고 살겠지요.아시는지요. 늦은 밤 쓸쓸한 밥상을 차렸을 불빛들이 꺼져갈 때 당신을 저주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목련이 죽음처럼 떨어져나갈 때 당신을 그리워합니다.목련이 떨어진 만큼 추억은 죽어가겠지요. 내 저주는 이번 봄에도 목련으로 죽어갔습니다. 피냄새가 풍기는 봄밤.- 위의 책 중 '목련이 죽는 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