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난 방과후 보충수업을 일절 하지 않는다. 예체능 과목도 아니고, 명색이 수능 필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인데도 여태껏 보충수업을 해본 적이 없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교과목 수와 양을 생각하면 정규 수업만으로도 벅찰 거라는 생각에서다. 주어진 정규 수업에 모든 것을 쏟아 붓자는 초임 시절의 다짐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 아이들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면 온통 수업으로 빡빡하다. 내 학창시절 때도 저랬나 싶을 정도다. 물론, 정규 수업만 떼어놓고 보면 주 5일에 하루 7시간꼴이니 별것 아닐 수 있다. 그게 다가 아니라서 문제다. 매일 두 시간씩 보충수업이 이어지고, 저녁 식사를 마치면 오후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 시간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1년 내내 한결같다.
내 학창시절과 견줘 분명 과목 수는 대폭 줄어들었는데 수업 시수는 외려 더 늘어난 것 같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수능에서 탐구영역의 과목 수가 넷에서 셋으로, 이태 전 다시 셋에서 둘로 축소됐지만, 아이들의 시간표는 과목 수만 줄었을 뿐 빈자리 없이 그대로다. 말하자면, 사회와 과학 탐구영역 자리에 영어나 수학이 한 시간씩 더 추가된 셈이라고나 할까.
'변함없는' 시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과목 수를 줄인다고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과목이 줄어들면 공부하기 쉬워질 거라는 생각은, 공부를 전쟁처럼 여기는 아이들의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져온 한낱 '착시 현상'일 뿐이다. 강고한 학벌 구조에다 서슬 푸른 대학입시가 살아있는 한 백약이 무효다. 사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사가 된 지 20년, 변하지 않는 보충수업
큰사진보기

|
| ▲ "교사가 된 지 얼추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보충수업은 많은 아이의 공부에 방해될 뿐이라고 확신한다." |
| ⓒ pixabay |
관련사진보기 |
내 학창시절 때도 보충수업은 있었다. 지금처럼 반강제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고, 대부분의 아이는 이를 끔찍이도 싫어했다. 납부금과 별도로 징수됐던 수업료를 다들 '삥'이라고 부르며 아까워하곤 했다. 그때 나 역시 보충수업 10시간보다 차라리 스스로 공부하는 1시간을 더 원했지만, 그걸 담임선생님께 건의했다가 흠씬 두들겨 맞은 기억이 지금껏 상처로 남았다.
'최소 수업에 최대 자습.' 교사가 된 이후에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다. 수업시간에 자습을 시킨다는 뜻은 아니니 괜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 그저 정규 수업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다. 교사가 된 지 얼추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보충수업은 많은 아이의 공부에 방해될 뿐이라고 확신한다. 나아가 보충수업은 학교 내의 사교육이 되어 정규 수업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보충수업에 대한 요즘 아이들의 평가는 어떨까. 내 학창시절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넌지시 물어보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시키니까 하는 것'이라는 퉁명스런 답변 일색이다. 과목에 상관없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숙제할 시간도 없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자습을 하면 더 낫겠다는 아이도 많았다. 그때 그 시절 그대로다.
그렇다면 보충수업이 학교에서 굳건한 이유는 뭘까. 교사가 되고 처음 보충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때를 기억한다. 이유를 물으면서 하나같이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다 모의고사 점수라도 낮으면 어떻게 할 참이냐며 걱정하는 얘기였다. 예나 지금이나 보충수업의 존재 이유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믿음이다.
아이들은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데도, 교사와 학부모는 이 '맹신'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다. '수업량과 성적은 정비례한다'거나 '엉덩이가 무거울수록 공부를 잘 한다'는 등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종교처럼 떠받들고 있다. 말하자면 '네 시간 자면 붙고 다섯 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수십 년 전 '4당 5락'의 요즘 버전인 셈이다.
정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 학생과 교사를 위한 길한 가지 재미있는 건, 보충수업이 아이들의 점수에 관해 교사들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점이다. 성적이 좋으면 문제 삼을 일 없을 테고, 성적이 낮으면 보충수업 시수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렇다고 특정 과목의 시수를 마냥 늘릴 수 없는 법이고 보면, 그만한 핑곗거리를 찾긴 어렵다.
하지만 보충수업은 종국에 교사의 역량을 시나브로 좀먹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연수와 학습 등 교육을 통해 교사가 스스로 재충전할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어나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온종일 수업만 하다가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적잖은 잡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들은 연수는커녕 하루 중 변변히 책 한 줄 읽을 겨를도 없다.
오래전 대학 때 배운 걸로 근근이 아이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면, 교사는 아이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러자면 당장 하루 중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이들조차 고개를 가로젓는 보충수업을 고집하는 대신, 그 시간에 정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교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아무튼 내 몫의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당장 아이들의 수업량이 줄지 않는다는 것쯤은 안다. 다른 수능 교과목으로 채워질 테니 말이다. 교사로서 보충수업을 거부하는 건 아이들이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남들 다 하는데, 왜 유별나게 구느냐는 것. '명료한' 그 말 한마디면 그걸로 끝이다. 그 어떤 논리도 근거도 다 필요 없다.
보충수업에 길들여진 교육 현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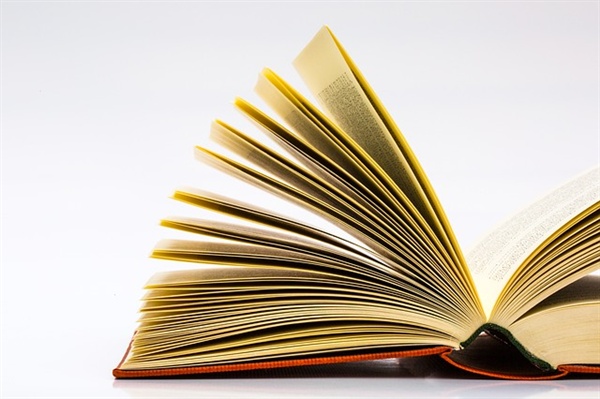
|
| ▲ "보충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은 있어도,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는 없다. 당장 보충수업에 길들여진 학교의 현실을 '해독'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
| ⓒ pixabay |
관련사진보기 |
언젠가 동료교사가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물어왔다. 내가 학교에서 3년째 도서관장 업무를 맡고 있어서 부러 질문한 것이다. 일과 중에 자유롭게 책 읽을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면 된다고 답했다. 보충수업보다 자유로운 독서 시간 한 시간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 덧붙였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지 보충수업을 건드릴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보충수업 없이는 교과서 진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동료교사의 말에 반론을 제기했다가 하마터면 다툼이 일어날 뻔했다. 만약 정규 수업만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배울 내용을 줄여야 옳다는 게 내 반론의 요지였다. 애초 보충수업을 전제로 학습량을 정했을 리도 없고, 보충수업 때 진도를 나가는 건 엄연히 불법이기도 하다.
사실 그가 에둘러 표현한 것일 뿐,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일 게다.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 문제의 적응력을 키우는 일이고, 그 첫 단추가 반복적인 기출문제 풀이라고 생각해보면 보충수업이 아니면 달리 방도가 없다. 대학입시에 모든 걸 맞춰야 하는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모든 교과목의 진도는 늦어도 3학년 1학기에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그와 나의 언쟁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보충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은 있어도,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는 없다. 당장 보충수업에 길들여진 학교의 현실을 '해독'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보충수업 대신 그 시간 연수를 받고 공부를 하는 교사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 그것이 학교 안에서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많은 교사들이 푸념처럼 내뱉는 '일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말에 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이 수천, 수만 번 바뀐다 해도, 아이들과 직접 부대끼며 가르치고 배우는 이는 오로지 우리 교사들뿐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