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과학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설립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은 당장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응용기술과 산업기술에 치중되어 온 반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미래를 위한 도약을 위해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일본의 이화학연구소(RIKEN) 등을 모델로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된 것이다.
2017년까지 대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완공하는 한편, 매년 100억 원 안팎의 연구비를 받는 50개의 연구단을 선정해 운영하는데 총 5조 1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초과학연구원은 국내에서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한 번 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우리나라의 과학 현실에서 기초과학 연구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과도한 연구비 책정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은 연구단장 1명과 4명의 연구그룹 리더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단장으로 선임되면 1년에 35억 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되고, 연구단장은 자율적으로 연구그룹 리더들을 뽑을 수 있는데 이에 1년에 15억 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따라서 실험을 하는 연구단의 경우 년 간 총 10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된다(실험을 하지 않은 연구단의 경우 년 간 총 40 억 원 규모).
이러한 연구비 규모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예로운 국가과학자로 선정되면 1년에 15억을 지원받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의연구과제에 선정되면 8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러한 규모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단은 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지원과제의 경우 핵심과제 1억, 도약과제 3억 원 수준이다.
물론 연구 규모에 따라서 많은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도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하는데 456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하지만, 연구과제의 성격과 상관없이 기초과학 전 분야에서 100억 원 규모의 연구단을 50개 선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연구비에 연구단을 맞추는 꼴이 되고 있다. 실제 몇몇 연구단에서는 과도하게 연구비를 지출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연 연구단의 성격과 상관없이 이러한 규모의 연구비를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연구비의 부족 2013년 현재 교육부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총 예산은 4조2647억 원으로 교육부 전체 예산(57조1344억 원)의 7.5%, 국가 전체 예산(342조 원)의 1.2% 수준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 전체 예산은 매년 5%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도 보이듯, 같은 기간 기초연구사업의 연도별 연구비 증가율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특히 올해에는 모두 증가율이 5%를 밑돌았다. 따라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학기술분야 지원이 소홀해 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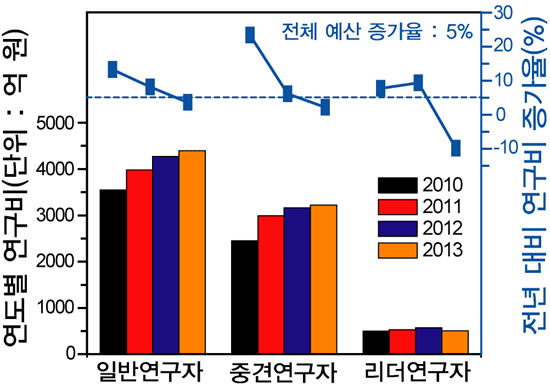
|
| ▲ 기초연구사업의 연도별 연구비 및 연구비 증가율 |
| ⓒ 청년과학기술자모임(YESA) |
관련사진보기 |
실제 올해 상반기 리더연구자 사업인 창의 과제는 경쟁률이 50:1이었고, 중견연구자 지원과제는 경쟁률이 12:1을 넘었다. 따라서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힘들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00억 원 규모의 연구단을 50개 선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풀뿌리 연구비를 늘리자는 주장도 과학계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연구단 선정의 문제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은 지금까지 2012년 5월 1차 9명(1명 사임), 2012년 10월 2차 7명, 2013년 4월 3명 등 총 19개의 연구단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큰데 반해, 연구단 선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일부 연구단에 대해서는 과연 100억 원의 연구단을 꾸려나갈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은 국내 연구자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지원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기존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 등에서도 외국 연구자에게 국내에 와서 연구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국내에 정착하기 보다는 단기간 연구비를 받고 이후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역시 이른바 '먹튀'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과학계 저변을 넓히고, 이공계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부터 해결해야물론, 당장의 이익을 내기보다 먼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연구비를 10여년 간 기초과학에 투자하겠다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근시안적으로 정책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출연한 연구소에서도 비정규직 연구원이 50%가 넘고, 학교 연구실의 많은 연구원, 테크니션들이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면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임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과학자 집단,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청년과학기술자모임(YESA)이 운영하는 블로그(yesa.tistory.com)에서도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