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오지마 섬을 점령한 미군이 수라바치 산꼭대기에 성조기를 세우는 장면. 이 한 장의 사진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는 영화가 <아버지의 깃발>이다. 사진 속 액자는 퓰리처상을 받았던 실제 사진(조 로젠탈 촬영). |
| ⓒ Warner Bros. |
관련사진보기 |
"너희들이 <아버지의 깃발> 보자고 성화 해놓고 영석이 너, 왜 연락도 없이 안 나왔어?" 호통치는 내 눈치를 보며 퉁퉁 부은 눈을 비비던 녀석이 간신히 입을 연다. "저기…, 인터넷에서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2 찾아 밤새 보느라…,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그런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마이클 스코필드(웬트워스 밀러 분), 캐릭터 정말 짱이에요. 선생님도 한 번 보세요. 저처럼 빠져드실 걸요? 주인공 눈빛, 아!" 고3에 올라가는 녀석이 그깟 할리우드판 드라마 때문에 연일 밤을 새우다니, 정신이 있니? 너 예비수험생 맞니? 해가며 야단을 치던 나는 문득 내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나 역시 중고생 시절 한 때, 할리우드 영화와 배우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로버트 드니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어쩌고 하면 밥 먹다가도 자리를 박찰 정도였다. 특히 두 배우의 눈빛 연기에 녹아들듯 매료되어버렸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푹 빠져 동네 극장을 전전했던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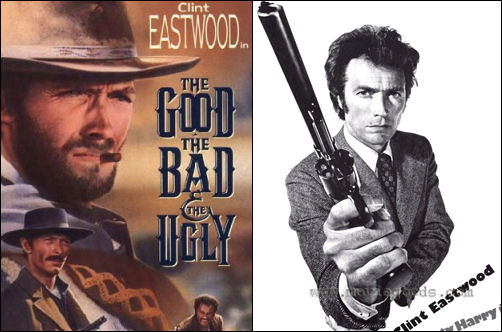 |
| ▲ 왼쪽 1966년 MGM 제작 <석양의 무법자>, 오른쪽 1971년 Warner Bros 제작 <더티 해리>. |
| ⓒ MGM. & Warner Bros. |
관련사진보기 |
누구보다도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석양의 무법자>에서 시가를 문 채 추호도 흔들림없는 눈빛을 흘리던 그의 모습은 소름이 몽글몽글 돋을 만큼 서늘하게 내 가슴놀이를 팠다. 엔리오 모리코네의 그 유명한 배경음악과 함께 화면 가득 그의 얼굴이 채워질 때면 숨이 멎을 판이었다. 그는 시나브로 내 우상이 되어버렸다. 1960∼1970년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낸 나는 <경미극장> <답십리극장> <시대극장> <오스카극장>을 잊지 못한다. 가끔은 중심가로 나가 <대한극장> <피카디리극장> <단성사>에서 개봉영화를 보기도 했지만 대개 동네 극장을 전전했다. 친구 아버지가 동대문구에서는 나름 큰소리치는 극장 간판 전문 화가였기에 앞서 열거한 네 군데 극장은 친구와 내게 늘 안방이었다. '미성년자관람불가' 딱지도 우리에겐 무소용이요, 똥 친 막대기였다. 그 덕분(?)에 <더티 해리> 연속물을 만날 수 있었다. 범죄자들을 냉혹하게 처형하는 형사 해리(클린트 이스트우드 분). 그가 무지막지한 권총 매그넘 44구경을 휘두를 때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너무나 잔혹한 총격과 적나라한 정사 장면에 충격을 받기도 했다. 미성년자가 볼 영화는 분명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더티 해리> 연속물을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바라진 어깨를 옹글게 으쓱거릴 수 있었다. 형사 해리의 잔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흉내 내기 위해 거울을 보며 연습까지 했다. 마치, 요즈막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53화에서 민호(김혜성 분)가 터프하게 보이기 위해 위압적(?)인 눈빛을 가공해 웃음을 자아낸 것처럼 당시 나는 부러 눈을 씰룩거리며 가관도 아니었다. "선생님! <더티 해리> 지금도 구해볼 수 있나요?" "글쎄다. DVD로 나와 있으려나? 그나저나 너희들은 보면 안 돼! 너무 비정하고 잔혹한 장면이 많아." "30년 전 영화가 잔혹? 에이, 선생님도 혹시 우리 아버지처럼 저를 아직 애로 보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선생님은 저희보다 어렸을 때 보셨다면서요?" "그야 뭐…, 나야 어릴 땐…, 원래 되바라진 데다 싹수까지 노랬거든(아이들 모두 웃음)."
중년이 되어 다시 돌아보는 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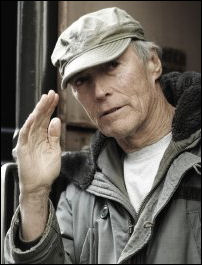 |
| ▲ 눈빛만큼은 여전히 청년인 내 우상. |
| ⓒ Warner Bros. |
관련사진보기 |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누가 뭐래도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3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78세. 희수를 넘기고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는 현역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할리우드판 영웅주의의 대표 수혜자였으면서도 전쟁의 무의미한 잔혹성과 미국식 영웅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비극을 냉철하게 짚어낸 영화 <아버지의 깃발>을 감독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몇몇 아이들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에 참여한 영화라는 사실을 놓치고도 <뮌헨>과 너무 닮았다고 얘기한다. 그만큼 스티븐 스필버그의 색채가 농후하다. 그러나 화면 곳곳, 인생을 관조한 사람만이 짚어낼 수 있는 응집력은 단연 클린트 이스트우드만의 색깔이다. 환갑 진갑 다 넘긴 뒤부터 더 열정적으로 감독하고 연기한 영화들, 특히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용서받지 못한 자> <밀리언 달러 베이비> 등이 모두 수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역량이 녹록하지 않음을 거니챌 수 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새록새록 힘이 솟구치는 할아버지(?), 과연 그의 비결은 무엇이란 말인가?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원하는 일을 죽기 전까지 하고야 말겠노라, 활화산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는 위대하다!" "선생님도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녀석, 참! 그것도 일 나름이지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고3들과 논술 씨름하며 살겠냐? 늙은 냄새 팍팍 풍기며 꼬부라질 텐데 누가 내 수업 들으러 온다던? 너 같으면 오겠니?" "선생님 평소…, 미국식 영웅주의라면 거품 무시잖아요. 그런데 할리우드식 영웅주의의 대표 격인 배우를 강렬하게 가슴 속에 담고 계시다니 선생님도 결국…, 할리우드 키드에서 벗어나진 못하셨네요." "부인하진 않겠다. 다만…, 어차피 백 년도 못 사는 인생, 노년 마지막까지 자기가 사랑한 일에 혼신을 쏟아 부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러울 뿐이다." 이런저런 영화 얘기를 나누고 나니 벌써 밤이 이슥하다. 제자들과 헤어진 뒤 나는 네온 불빛이 휘황한 학원가를 등진 채 붙박인 듯 서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이 늙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꼭뒤를 잡아끌어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만큼은 아니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