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의 부수가 셀프 인증으로 만들어진 거짓 숫자이며, 종이신문에서 집행되는 광고도 광고 효과에 따른 정상 거래가 아닌, 일종의 약탈적 성격의 고정비용 같은 것이라는 점을 지난 몇 차례 글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종이신문의 부수와 광고의 실체는 언론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불투명한 경영, 거짓의 숫자, 반시장적 행태, 언론의 위세를 동원하는 갑질 등 여러 비정상이 뭉쳐 있다.

▲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업 불투명성 비판하면서 신문사는
언론은 기업이나 공적 기구의 문제들을 비판할 때 불투명한 회계와 경영 행태를 늘 비판해 왔다. 그런데 정작 신문은 신문기업 경영의 가장 기본이랄 수 있는 신문 부수부터가 정확하지도, 진실 되지도 않다.
게다가 신문 경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와 협찬 등은 시장 원리에도 어긋나고 기업 윤리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신문 경영이 거짓과 비정상 위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이런 존재가 진실, 정확성, 공정성, 정직을 핵심 가치로 지향하는 언론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온당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기본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거짓과 비정상은 대다수 한국 신문에 원죄처럼 따라 다니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신문의 이런 모습을 보다가 최근 영국의 신문 소식을 전해 들으니 두 나라의 간극이 참으로 까마득히 먼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달 발간하는 <신문과 방송> 8월호의 미디어월드 와이드 영국 편은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영국 사례를 따르면 한국 신문은 어떻게 될까
이 기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영국 저널리즘을 소개하면서, 특히 유료 부수의 격감을 걱정하는 신문사들이 영국 ABC협회에 부수 인증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신문 부수 공인기구인 영국 ABC협회는 매달 영국 일간지의 유료 부수 발행을 공개하고, 광고주는 이를 참조해 광고 단가를 정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료 부수의 격감이 신문사 광고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일부 신문사들이 부수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텔레그라프>, <선>, <타임스> 등 영국 신문의 '톱'으로 여겨지는 일간지들이 ABC협회 측에 발행부수 인증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전례없는 요청을 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ABC협회 측은 비공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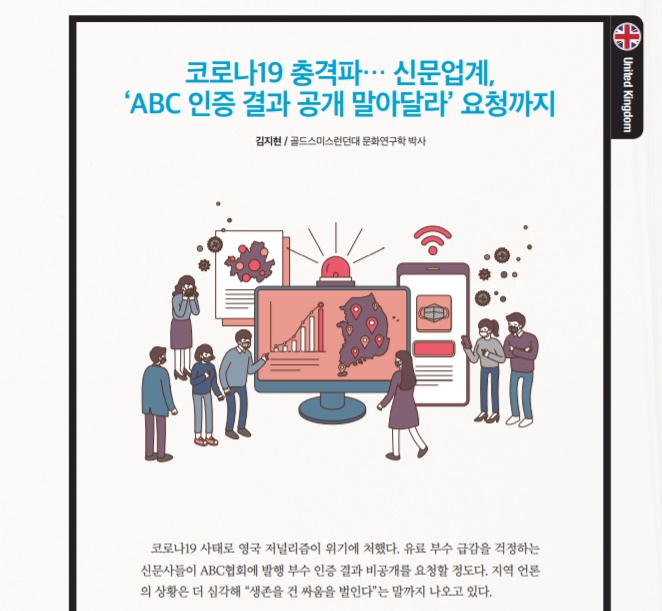
▲ <신문과 방송> 8월호 <코로나19 충격파... 신문업계, 'ABC인증 결과 공개 말아달라' 요청까지> ⓒ 신문과 방송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영국 ABC 협회는 매달 신문 부수를 발표하고 있구나, 그 부수가 바로 광고 단가와 직결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구나, 발행 부수가 정확하니 광고주들이 광고 단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겠지, 만약 영국처럼 공신력 있는 ABC 협회가 한국 신문의 발행 부수, 유가 부수를 매달 조사하여 발표한다면 한국 신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결국 신문 부수의 정확성, 신문 광고 집행의 정상거래 문제만 놓고 볼 때 한국 신문과 영국 신문 사이의 차이는 거짓과 진실, 비정상과 정상의 차이만큼 크게 느껴진다.
TV와 신문 광고의 차이
한국 신문의 경영과 상거래의 비정상적 실체는 특히 방송 매체의 광고 집행과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종이신문의 광고 집행과 달리 TV 방송의 경우 광고의 효율을 따져 광고를 결정하는 여러 지표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광고 시청률,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보는 2049 광고 시청률, GRP(Gross Rating Points 종합 시청률), CPRP(Cost Per Rating Point. 타깃 소비자 1%에 광고가 도달하는 비용) 등이다.
광고 시청률은 광고가 방송되는 시간의 개인 시청률인데, 1분 단위로 측정된다. 2049 광고 시청률은 구매력이 높고 광고에 영향을 받아 구매까지 이어진다고 여겨지는 20-49세 사이의 젊은 세대의 개인 광고 시청률이다.
시청률과 광고 관련 지표가 구체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사례를 한번 보자. KBS 2TV의 주말 연속극의 어느 하루 시청률과 광고 시청률 내용이다. 이날 주말 드라마의 가구 시청률은 30%, 개인 시청률은 12%, 2049 시청률은 8%가 나왔다. 그런데 광고 지표를 보면, 광고 시청률이 6%, 2049 광고 시청률은 3%가 나왔다.
광고주들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시청률을 바탕으로 더 세밀한 지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광고를 집행한다. 1분 단위로 측정되는 광고 시청률과 2049 광고 시청률을 바탕으로 실제 집행된 광고총액을 더해 소비자 1%에 광고가 도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계산한다. 여기에 연령별, 지역별, 성별 등 다양한 분석 자료가 실시간으로 또는 방송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나온다.
TV 광고가 이처럼 세밀한 근거를 바탕으로 광고가 결정되는데 비해 신문은 광고 효과와는 무관하게 신문사별로 '할당'되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처럼 여겨지는 '기이한 광고'가 되어버린다. 이 과정에서 기자가 '광고 영업'을 하는 것은 다반사가 되었고, 그 주고받는 방식이 '을'인 기업 처지에서는 '갑'인 신문사가 약탈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 종이신문의 미래? ⓒ pixabay
'약탈적 영업방식'이라고 보는 기업 쪽 시각
광고 업무를 오래 해온 한 광고인(익명 요구)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점잖게 표현하면 신문의 광고 영업력이 다른 매체에 비해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문의 광고 영업은 약탈적 영업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대형 광고주는 광고 효과는 상관하지 않고, 신문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광고를 배분 집행하고, 특히 재벌 회사의 경우 오너 리스크(owner risk)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문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신문 쪽에도 '광고 열독률'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신문(또는 잡지)의 광고를 보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자료가 거의 만들어지지도 않고,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신문이 광고 열독률을 조사하려면 정확한 구독자 숫자를 통해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초 자료가 되는 신문 부수 자체가 엉터리이니, 제대로 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문의 광고 열독률이나 실제 광고 효과의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광고 현장에서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은 신문 광고가 광고 효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고정비용'으로 '할당'되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신문 광고 현실을 반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광고계에서 TV 광고와 신문 광고의 효율성과 광고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자료도 없다. 신문의 자료가 너무 엉터리다 보니 비교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