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 전쟁을 주도했던 많은 주역들은 이미 사라졌다. 그 전쟁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 또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식민지배보다 큰 비극이었던 분단과 전쟁. 이 이야기는 그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한 소년의 경험과 성장기다.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증언을 해준 이철옥의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진솔하다. 높고 고창한 관념의 말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서 길어 올린 구체적 삶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다. - 기자 말
큰사진보기

|
| ▲ 병기부대서 차량정비와 운전을 배운 철옥(사진)은 지휘관의 지프차를 운전했다. 아래는 모래마대를 깔고, 적의 철선을 막기위해 앞엔 철책을 대는 등 군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
| ⓒ 이철옥 | 관련사진보기 |
"춘천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은 소양강 물이 많지만, 그땐 댐이 없으니까, 안쪽으로 호를 파놨더라고. 들어가기 직전에 쓰라고 방한복을 줘요. 솜을 넣은 방한복인데, 짧아요. 방한모가 없고, 애리(목깃)만 커요. 손가락만 있고 네 손가락은 한 데로 된 장갑 있지 않아요. 그걸 끈 매서 주고…
철모를 배정받았는데, 화이바(내부 고정 받침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모에 쓰고 끈을 졸라맸어. 밤중에 받았으니까는 깃을 올릴라는데 뻣뻣해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날 보니까 피가 묻어 굳어 있는데, 보니까 옷자락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구멍 일곱 개가 뚫려있더라고."
청년 이철옥이 입대한 시기는 1953년 봄이 끝나가는 시절이었다. 그가 자대, 그러니까 그가 나머지 군 복무를 하게 될 부대를 찾아 들어갈 때는 아마도 남도에서는 서서히 봄이 오는 시기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전장 안의 그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다.
"그래 도착했는데, 포격부대가 주둔하면 산을 등지고 있잖아요. 천막 치고 반은 지하고, 포탄 피해야 하니까. 근데 거기 동네 전체가 다 시신이야. 밭둑이 온전치 않고 희미한 곳은 다 시신이야. 다 밭고랑만 툭툭 쳐서 덮은 거야. 가다 발이 푹 빠지면 시신이야. 그럼 신을 못 신어. 벗어버려야 하고. 거기 평평한데 곳에 낮게 기와지붕만 보이는 게 있었다고, 집은 형체도 없는데…
북쪽으로 가면 마루가 높아요. 그래 그곳을 북한군 애들이 야전병원으로 쓴 거야. 전황이 급하니까 환자들 있던 고대로 폭파시켜 버린 거지. 대대장이 대령, 부대장이 차중령이라고 기독교 신자였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묻어주자 해서… 우린 거길 해체해야 할 거 아녜요? 헤치다 보니까 다 시신이야."
병사들의 전쟁
그것이 병사들의 전쟁이었다. 장군들이 지도에서 선을 긋고, 모형 전차를 이동해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면, 병사들은 장비와 몸을 움직여 그 지점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었다. 땅을 빼앗으면서 혹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은 목숨을 내놔야 했다.
한번 빼앗은 땅은 주인을 여러 차례 갈아치우며 그 자리에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병사 뒤를 이어 다른 병사가 피를 흘리며 땅에 다시 누웠다. 그렇게 죽어간 병사들을 보면서 아직 살아있는 병사들을 보는 이철옥은 연민을 느꼈다.
"그때 우린 겁도 없었어. 어떤 시신은 탈골이 돼 가지고. 우리가 천막에서 끼고 자고 그랬다고, 애처로워서. 어떻게 보면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시신을) 안고 잤다고. 안고 댕기다가 양지바른 데다 묻어주고 그랬다고."
-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전이 되었네요. 전쟁이 끝나길 엄청나게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휴전된다고 전쟁이 끝나는 거 같죠? 아니에요. 군사분계선이 생겼죠? 휴전선.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고. 텔레비전 잠깐 나오던데 말뚝만 하얀 페인트칠해서 박아놨었다고. 철망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북한군하고 나하고 같이 보초 서 있는 거야. 마주 서 있는 거야. 그때만 해도 싸울 생각도 별로 없고.
근데 밤에 문제라. 밤에는 마주 섰다가 졸면 모가지가 없어지는 거야. 철의 삼각지 일대는 저녁에 근무하러 나가잖아. 옛날 전자식, 돌리는 전화기를 보초한테 하나씩 쥐여 보낸다고. 중대장이 돌려 재낀다고. 유선을 끌고 나갈 때는 한 선이고, 거기서 쁘라치(도용)해서 쓰는 거야. 근데 졸면은 귀도 잘라가고 (목을 가리키며) 이것도 잘라가고. 그러니까 보초 서러 가면, 총소리 나지 않는 전쟁이 지속됐던 거예요."
- 그렇겠군요. 이제 막 휴전이 됐지만 이젠 오히려 남북 군인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게 된 상황인 거군요.
"그때 우리끼리 하던 말이 있어요. (상대) 머리를 떼오면 한 달 휴가, 중공군 농구화 갖고 오면 하루 휴가. 그때 걔네들은 마카오제, 고무 농구화를 신고 왔다고. 홍콩의 마카오 신발. 그거 뺏어오면 특별휴가 가고. 나는 한국 농구화를 신었었는데 보름만 신고 다니면 뚝 부러져. 옷을 입고 일주일만 입고 햇빛에 뛰어다니면 하얗게 돼. 왜냐면 그땐 광목에다가 물감을 들여 입은 거기 때문에. 철의 삼각지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이 많았다고.
휴전되고 난 뒤 어느 날 얘긴데, 얼마 안 됐어요. 오피(OP, 관측지)
가 한참 높아요. 오송산이. 한국군이 세 번 공격해서 중공군한테 네 번째엔 빼앗겼다고. 삼부능선까지만 차지하고 위는 다 걔들한테 빼앗겼다고. 얼마나 포격을 많이 했는지 그 지형이 4m가 얕아졌다고 그래요. 이쪽에서 볼 땐 벼랑인데 위에서 보면 멀리 평야 같다고도 하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유명한 어구가 있는 철로는 백마고지역이다. 비무장지대 월롱역은 기차가 다닐 수 없고, 남한 기차가 공식적으로 달릴 수 있는 최북단 역이다.
그 백마고지역에서 조금 북으로 걸으면 백마고지 전망대가 있다. 백마고지에 올라가면 인근의 낮은 평야 지대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곳은 휴전을 앞둔 열흘의 기간 동안 주인이 24번쯤 바뀌었다. 워낙 많은 포격을 받아 살(흙)은 모두 깎여 없어지고 뼈(바위)만 남아 백마 형상을 했다. 그 백마의 형상은 여전히 달리고 있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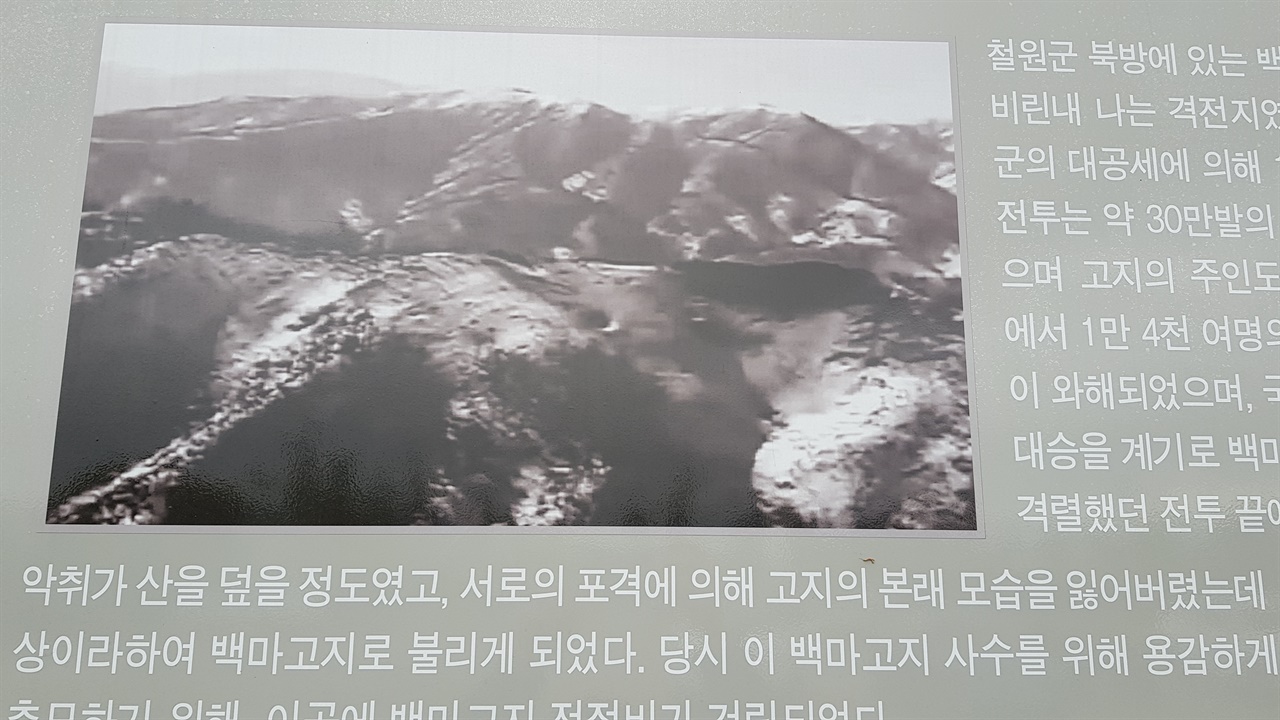
|
| ▲ 백마고지 전적지의 안내비의 일부, 그에 따르면 백마고지는 스물 네번 주인이 바뀌고, 30만발의 포탄이 쏟아졌다. |
| ⓒ 원동업 | 관련사진보기 |
- 그때 어떤 대치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원래 사단 소속이 아닌데, 우리 부대장이 날 사단장한테 빼앗겨가지고 나는 사단에서 최전방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내가 지프차 몰고 다니잖아요. 차 다니는 길에 왜정시대 심어놓은 가로수가 다 탔지마는 드문드문 남아 있잖아요? 거기다가 강철을 활 모양으로 댕겨서 해놓는다고, 목에 닿게. 윈도우(차 창) 있지만, 위장망 씌워야 하니까. 왜냐면 윈도우가 반사돼서 들키니까.
그거 젖혀놓고 거기 위장망을 씌워.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나 장교가 그걸 툭 치고 간다고. 그렇게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철주. 철조망 박는 철주,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걸 이렇게 가시 빔으로 맨들어가지고, 범퍼 앞에다가 설치하고 당겼다고. 그리고 차 밑바닥에다가 전부 공병대 모래 마대 있잖아요. 그걸 전부 깐다고. 밑에 지뢰를 묻어놓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차 안에다가 전부 깔고."
- 장군들 차를 운전하게 되면 편한 보직이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만.
"안 그랬어요. 하루는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 이렇게 별이 여덟 개가 내 차에 탄 거요. 그날 나는 목이 날아가는 줄 알았다고. 걔네들이 위에 있고 우리가 밑에 있으니까 저격용 총을 쏘면 다 맞는 거여.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다른 데는 빙빙 돌아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여기 이 산은 직선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차가 사람보다 위에 있어. 차 통로를 더 높이 판 거야.
하늘밖에 안 보여. 옆 벽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군단 헌병대장이 '컴, 보이' 하며 먼저 가는데 차가 능력이 있어야 따라가지. 그때 지프가 44년식이요. 엔진 수명이 6개월이요. 6볼트요. 아주 말도 안 되지. 그날 영하 32도였어요. 그날 너무 조심스러워서 내가 엔진오일을 5밀리를 더 넣었어요. 한 삼 분의 일쯤 올라가다 첫 오피(관측지)에 올라가기 직전에 부룩부룩 차가 이상해요. 돌릴 수도 없잖아. 백미러를 딱 보니까 차가 소독 연막 하듯 연기가 나는 거야."
그의 차는 겨우 중간 기착지까지 올라갔다. 장군들은 벙커로 들어갔다.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는 긴장했지만, 늘 응급처치 부속을 가지고 다니던 그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쁘라크(플러그)를 갈고 오일을 뺐다. 평소 정비를 잘해둔터라 차가 꺼지지는 않았다. 엔진이 꺼졌다면 그는 핸들을 틀어 차를 벽에 충돌시킬 생각이었다.
"한숨 돌리고 있는데 디엠지(DMZ, 비무장지대) 갔던 군인 하나가, 일본 애들 밥통을 들고 쫓아왔어. 별 넷인 장군들한테 어디 이등병들이 와요? 보초 섰다가 자기가 죽겠으니깐 온 거예요. '불을 달라'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우니까 불이 없어요. 밥통을 열어보니 쌀이 바닥에 이렇게 깔렸어요. 불이 없으니까 밥을 못 해 먹은거야. 그래 얼른 머리가 돌아간 게, '내가 밧데리(배터리)를 합선시키면 불꽃이 튈 거다.'
내가 철조망을 잘라가지고 차 위장막을 풀어서, 휘발유 통에 이만큼 잠갔어요. 잘못하면 밧데리가 폭발해버려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점화를 시켰다고, 불꽃이 탁 튀더라고. 그래서 불을 만들어 줘버렸어요. 그때 그걸 가서 밥을 해 먹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런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군 생활을 하던 철옥은 1957년 7월에 전역한다. 이등병에서 차근차근 계급을 따고 올라가는 병사이지만, 그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할도 해낸 것이다.
큰사진보기

|
| ▲ 한국전쟁 당시 철모에 진달래 꽃을 꽂은 병사 분단과 전쟁의 시간들 속에서도 삶은 지속된다. 6.25를 통과한 철옥의 모습은 한국 현대사를 지켜온 민중의 모습이기도 했다. |
| ⓒ 원동건 | 관련사진보기 |
6.25 전쟁을 통과한 철옥의 모습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를 묵묵히 전진시켜온 민중들, 시민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현재에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시선은 과거로 향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이며, 여기에 어떻게, 왜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과거를 과거로만 치부해버리면, 미래도 함께 버려질 것이기에.
['한국전쟁 70주년-길 위의 소년']
①열네살 때 탈북, 열일곱 때 전쟁... 그의 기구한 사연 http://omn.kr/1o0bx
②월남하다 마주친 공산군의 놀라운 한마디 http://omn.kr/1o0e3
③총 든 이웃의 등장, 뺏고 뺏기던 6.25전후 피난민의 삶 http://omn.kr/1o0g2
④"무기도 처음 본 애들이 중공군 기습, 그땐 그랬어요" http://omn.kr/1o0fi
⑤"죽고사는 건 운명" 말한 훈련병, 대령의 반응은 http://omn.kr/1o0fh
덧붙이는 글 |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전쟁 이야기들이 발굴되고 있다. 1947년 함경남도에서 삼팔선을 넘어 1950년 최전선 강화도에서 전쟁을 맞고, 거제도와 제주도, 강경과 부산을 거쳐 최전방 춘천과 철원으로 돌며 전쟁을 치룬 한 개인의 이력 역시 들여다볼 가치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