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①]
'채식인'과 '채식주의자'는 다르다[1-②]
돼지가 고통을 느끼면 삼겹살 대신 샐러드 먹어야 할까우선 지난 이야기 정리...
지난 글에서는 동물해방론자 피터 싱어 교수(프린스턴대)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해설했다. 또한 싱어의 주장에 대한 맹주만 교수(중앙대)의 비판도 소개했다. 앞의 내용을 이미 숙지한 독자는 스크롤을 내려 최훈 교수(강원대)의 반론을 소개하는 부분부터 읽어도 좋다.
| 1라운드 요약 |
싱어는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인 '감응력'을 도덕의 잣대로 제시하고,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는 통념을 깨부순다. 그는 여러 과학적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동물과 인간은 근본적 차이가 없으며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어서 동물을 차별할 이유란 없으며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물론 싱어가 주장하는 고려의 평등이 동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대우의 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그게 가능한지도 중요하다). 다만 잡아먹히는 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 정도는 명백하니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싱어는 '고통을 의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생명을 세 종류로 나눈다. 자의식과 의식이 있는 생명(인격체), 의식만 있는 생명, 의식도 없는 생명. 싱어는 우선 자의식에 결함이 있거나 자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유아나 식물인간 등 자의식에 결함이 있는 인간은 먹지 않는데 동물은 먹는 건 명백한 이중잣대이며 종차별주의라는 것이다. 또한 자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면 동물의 심각한 불이익을 담보로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육지 동물과 어류는 물론이고 갑각류도 먹을 수 없다. 한편 의식이 없는 생명은 비록 주장의 힘이 약해지지만 역시 제한적이다. 한 동물에게 가하는 손해는 다른 동물이 얻는 이익으로 균형을 이룰 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동물이 즐겁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고, 그 가족들도 고통스럽지 않고, 그의 죽음이 없었다면 생존할 수 없던 다른 동물의 삶으로 대체 가능할 때만 육식이 허용된다. 따라서 싱어는 강경한 채식주의자다. 싱어는 공장식 축산은 마땅히 사라져야 하며 동물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줘 얻는 고기는 사치 식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맹 교수는 '왜 굳이 감응력이 도덕의 잣대가 되어야 하느냐'고 의문을 던진다. 생물계에는 감응력 말고도 다양한 속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싱어에게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식물은 애초에 생물학적 의미 이상을 갖지 못 한다. 이는 싱어가 과연 식물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고려를 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또한 싱어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구분하지 않는다.
싱어는 다양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걸 부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고통 이상의 존재라 어떤 일이 즐거움은 덜해도 단지 '가치'가 있는 일이기에 더 큰 고통을 허용할 수도 있다. 고통도 때때로 가치를 가질 수는 있지만 다른 가치들과 분리시켜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의 윤리학은 고통 이상의 토대 위에 정초되어야 하며, 사소한 즐거움 때문에 과도한 고통을 가하지 말라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동물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지겠만, 고통 중심 윤리학처럼 고통만을 기준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게 맹 교수의 반론의 요지다. 요약 끝.(필자)
|
"백번 양보해도 소·돼지·닭 먹으면 안 될 근거 탄탄"이번에는 맹 교수에 대한 최훈 교수(강원대)의 반론을 소개/해설/논평한다. 최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호주 멜버른대 등에서 연구를 하다가 현재 강원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쓴 책은 <동물을 위한 윤리학>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등이 있다. 단, 해석은 해석자의 몫이므로 필자의 해석이 최 교수의 실제 의도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필자)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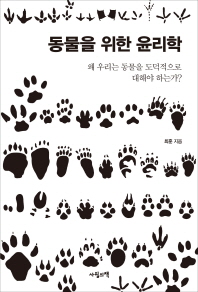
|
| ▲ <동물을 위한 윤리학>(최훈 / 사월의책 / 2015 / 1만8000원) |
| ⓒ 사월의책 |
관련사진보기 |
최 교수는 우선 '왜 도덕의 기준선을 감응력에 그어야 하느냐'는 질문(맹주만, 2007:244)에 답한다. 정신 능력 차원에서 감응력보다 높은 곳 혹은 낮은 곳에 긋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높은 곳인 지능이나 합리성으로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건 임의적이다. 이 경우 피부색을 갖고 차별을 하는 사람도 비판할 수 없게 된다.(최훈, 2009:199)
지능이나 합리성 개념을 규정하는 일 자체도 심리학에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설사 이 문제가 해결된들 지능이나 합리성을 보편적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편견일 수 있다. 과거 백인들은 흑인이나 황인들이 자신들보다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국주의 침략을 일삼았다. 하지만 인류학의 성과들은 단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뿐 관점을 바꾸면 흑인이나 황인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한다.(필자)
그럼 감응력보다 낮은 곳에 도덕의 기준선을 그으면 어떨까.(필자) 실제로 생물계에는 감응력 말고도 여러 속성이 있다. 맹 교수는 인간과 동물은 모두 고통을 느끼는 편이 유용하도록 진화했기에 둘 다 고통을 느낀다고 봐야 한다는 싱어식 논리라면, 식물도 고통과 유사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꼬집는다.(맹주만, 2007:244).
하지만 최 교수는 논리적 차원에서만 타당할 뿐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한다.(최훈, 2009:200) 식물은 동물처럼 중앙 집중적 신경 체계가 없으므로 고통을 발견할 수 없다(피터 싱어, 1997:97)는 이유에서다. 결국 식물의 '사실적 차원의 고통'은 실증된 적이 없고, 고통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건 최 교수가 보기에 정당하다.(최훈, 2009:201)
만약 고통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게 정당하다손 치더라도 고통이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필자) 맹 교수는 동물의 경험과 인간의 경험을 과연 동등한 비중으로 고려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묻는다.(맹주만, 2007:246) 최 교수는 맹 교수가 싱어를 오해했다며 싱어가 '대우의 평등'이 아닌 '고려의 평등'을 주장했음을 상기시킨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 가족까지 걱정하므로 (같은 조건일 때) 인간의 고통을 더 생각해야겠지만, 그게 동물의 이익도 고려하라는 원칙 자체를 무너뜨릴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익을 비교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동물을 죽여 인간이 얻는 이익이란 '입맛' 정도의 사소한 것에 불과한 건 명백하다.(최훈, 2009:202~204)
하지만 동물이 과연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필자) 최 교수는 어떤 존재가 자신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을 "2차 의식"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2차 의식은 감응력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도덕의 기준선을 위치시키지만 지능이나 합리성만큼 임의적이지는 않음을 인정한다.(최훈, 2009:207~208)
다만, 2차 의식을 도덕의 기준선으로 잡으면 인간 중에서도 2차 의식이 없는 존재들이(가령 유아나 식물인간) 문제가 된다. 또한 동물의 행동 등을 관찰해보면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이것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이 비슷하다는(소리를 지르거나 발버둥 치거나 등등) 약한 유비 추론에서 성립된 상식이기는 하다.(최훈, 2009:208)
하지만 상식을 뒤엎고자 2차 의식이 있어야만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을 하려면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이 져야 하고, 인간이 육식으로 얻는 (잠정적) 이익이 현존하는 동물의 고통을 능가하지 못하므로, "백 번 양보해도 싱어의 주장은 적어도 소, 돼지, 닭에 대한 육식을 반대할 행동적 지침은 분명히 제공해준다"는 게 최 교수의 결론이다.(최훈, 2009:208~210)
[생각해보기] 고통만으로 보편적인 도덕의 기준이 성립할까?최 교수는 감응력 외에 다른 정신 능력들이 왜 도덕의 기준선이 될 수 없는지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여전히 감응력이 독립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선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싱어와 최훈 교수의 지적처럼 식물은 중앙 집중적 신경 체계가 없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실증된 적이 없을 수도 있다.(필자)
하지만 최 교수가 맹 교수를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맹 교수는 생명계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음을 지적했는데, (싱어처럼 진화생물학적 유용성을 따지자면) 이것들로부터 식물에게도 고통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창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감응력과는 유사하지만 어쨌든 다르다.(필자)
이 능력은 감응력의 증거인 "중앙 집중적 신경 체계"의 존재로 실증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럼 정말 식물은 고통을 못 느낄까? 이것은 철학자들보다는 생물학자들이 답 할 몫이다. 오히려 윤리학의 핵심은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사실'이 곧바로 어떤 '가치'나 더 나아가 '당위'를 이끌어내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다.(필자)
큰사진보기

|
| ▲ 인간의 사소한 이익 때문에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게 무언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
| ⓒ pixabay |
관련사진보기 |
맹 교수가 동물과 인간의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묻는 이유는, '대우의 평등'이 가능하겠냐는 게 아니라 동물의 고통을 인간이 공정하게("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필자) 맹 교수가 인간이 우선 자신의 삶을 이해해야만 동물의 고통에도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맹주만, 2007:249).
이 말이 맞다면, 싱어의 고통의 윤리학조차 선험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한계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고통만으로 종을 초월한 보편적인 도덕의 기준이 성립할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와 동시에 타인과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무언가 찝찝하다. 해답은 무엇일까. 연재를 진행하면서 차차 찾아봐야 할 것 같다.(필자)
참고문헌맹주만, '피터 싱어와 윤리적 채식주의' <철학탐구> 22,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07.최훈, '맹주만 교수는 과연 피터 싱어의 윤리적 채식주의를 성공적으로 비판했는가?' <철학탐구> 25,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09.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황경식·심성동 옮김, 철학과현실사, 1997.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new revised edition, New York: Avon Books, 1990.Singer Peter, "All Animals Are Equal.", in Philosophic Exchange 1, summer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