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은 오마이뉴스 에디터의 사는이야기입니다.[편집자말] |
오마이뉴스는 열린 플랫폼이다. 모든 시민이 기자를 쓸 수 있는 곳이니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은 시민기자 마음에 달렸다(단, 징계를 받아 강제 탈퇴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겠다). 들어올 때 눈도장 확실히 찍은 시민기자라면 나갈 때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티가 난다. 작든 크든 서로의 마음에 흔적이 남는다.
"기자님, 연재는 보통 언제 끝내나요? 저... 이번에 쓴 글로 연재 그만 하려고요."
6개월 연재하셨다. 첫 기사부터 내가 점 찍은 시민기자였다. 안 그래도 연재 글이 뜸해서 신경이 쓰였는데, 시민기자님이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고 했다.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기분이 좀 그랬는데 이럴 줄 알았나 보다.
"어머, 정말이요? 안 돼요. 기자님" 하고 크게 호들갑 떨지는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일인 척했다. 연재를 중도에 끝내게 된 것에 대해 기자님이 더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전혀 없는 일도 아니니 괜찮다"라고도 말했다. 너무 평온하게 말해서 어쩌면 그가 조금 서운했을지도 모르겠다. 마음은 정반대인데...
열심히, 그것도 잘 쓰는 시민기자가 '이제 기사를 그만 쓰겠다'는 말을 들을 듣게 될 때가 있다. 많이 당혹스럽다. 내 눈 앞에서 "그만 쓰겠다"는 말을 들을 때면 그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난감할 때도 많았다. 그 어색한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서 아무말대잔치를 하다가 돌아선 적도 있었다. 시민기자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 '왜 그랬을까' 계속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이제는 조금, 누가 먼저 말을 꺼내나 싶은 마음이 쌓여가는 침묵의 시간도 이길 줄 안다. 작가 은유의 말처럼 '침묵은 정지의 시간이 아니라 생성의 시간'이니까. '무슨 말이든 하고 싶지만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자 언어를 고르는 시간, 글을 쓴 이의 삶으로 걸어 들어가 문장들을 경험하고 행간을 서성이고 감정을 길어내는 활발한 사고 작업의 과정'이 침묵이기도 하다는 것을 글에서 배웠다.
그런 침묵의 시간을 몇 번 넘겼을까. 내가 고른 언어는 '질문'이었다. "사는이야기를 쓰는 시민기자에게 꼭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처음 물어보는 건데 사는이야기를 쓰는 동안 무얼 배웠냐"라고. 기자님은 어려운 질문이라고 즉답을 못하셨다. 괜찮다고, 다음에 생각나면 꼭 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리를 옮겨 이어진 대화에서 그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제가 뭐라고... 제 글을 보고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힘들지만, 너를 보고 견딘다고. 제 글이 어느 누군가의 삶에 조금 영향을 준다는 것, 사는이야기 쓰면서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좋은원고료도 주시고."
아, 나도 그랬다. 나는 최다혜 시민기자가 쓰는 연재 '최소한의 소비'를 읽으며 나의 소비를 돌아본다.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 주말에 외식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은 거뜬히 넘기는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동네마트에서 1만5천(최다혜 시민기자의 장보기 습관이다) 이내로 소소하게 장을 본다. 대충 요리하고, 가족들과 맛있게 먹는다. "엄마가 했지만 너무 맛있지 않냐"라고 추임새도 마구마구 넣으면서. 외식보다 나은 한 끼, 잘 먹었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이야기의 영향력은 독자의 행동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글을 직접 쓰게도 한다. 22일 첫 기사를 쓴 새 시민기자가 취재 경위에 이런 글을 남겼다. '바리스타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카페 주인의 글을 정기 연재했던 글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주인장으로서의 카페와 회사원으로서의 카페가 많이 다른 것 같아 직접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라고.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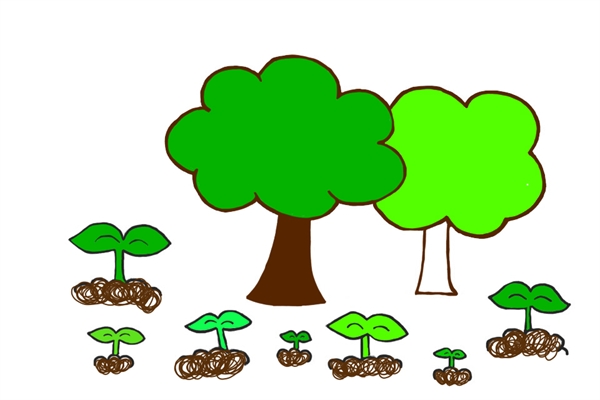
|
| ▲ "시민기자"라는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든 계속 진행 중일 거다. 손그림 금경희, 채색 이다은. |
| ⓒ 금경희 | 관련사진보기 |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는 마음의 씨앗은 '거기 그 카페'를 연재하고 있는 이현웅 시민기자가 뿌린 거다. 자신의 직업인 바리스타 이야기로 첫 기사를 쓴 김자영 시민기자는 그 씨앗을 잘 받아서 싹을 틔운 거다. '시민기자'라는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든 계속 진행 중일 거다.
이현웅 시민기자도 배지영 시민기자가 뿌린 씨앗을 받아 싹을 틔운 거였으니까. 박효정 시민기자도 마찬가지. 김용만 시민기자가 뿌린 씨앗을 잘 가꿔 지금은 줄기며, 잎이 한창 뻗어올라가는 중이다. 그 김용만 시민기자도 이윤기 시민기자가 뿌린 씨앗을 받아 싹을 틔웠다고 들었다.
연재를 중단하겠다고 한 시민기자도 그랬다. 그와 처음 연락했을 때 '우연히 사는이야기를 보고 이런 글이라면 나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넣었다고 말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상 연재를 중단하신다고 하셨지만, 나는 다시 돌아오실 거라 믿는다. 실제 그러는 시민기자들도 굉장히 많다. 앞에서 말했지만, 오마이뉴스는 열린 플랫폼이니까.
그동안 편집기자인 나는 어딘가에서 씨앗을 받아 뿌리내리기 시작한 싹들을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게 해야지. 오래오래 푸르게, <오마이뉴스>라는 숲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