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이 될 소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 중국 제선왕이다. 왕의 측은지심 덕분에 소는 생을 연장했다. 소 대신 제물이 된 건 바로 양이다. 맹자는 제선왕의 측은지심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반려동물과 가축을 구분하는 우리네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감이 가능한 동물과 그렇지 못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지능이라면 개, 고양이 못지않은 게 바로 쥐와 돼지다. 그럼에도 쥐는 불결함과 등치 된다. 과체중인 사람을 향해 '돼지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보신탕 섭취는 야만적인 행동으로 치부되지만, 돼지나 소를 먹는 건 상식적인 식습관으로 통한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걸맞게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역시 성숙해지는 듯 보인다. 얼마 전 유기 동물 안락사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향한 반려인 및 시민들의 반응도 그중 하나다.
물론 현재의 동물권 담론은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 어떤 동물은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만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동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천부인권이 사실상 허구나 다름없는 것처럼 동물권 역시 쟁취해야 하는 개념인 듯 보인다.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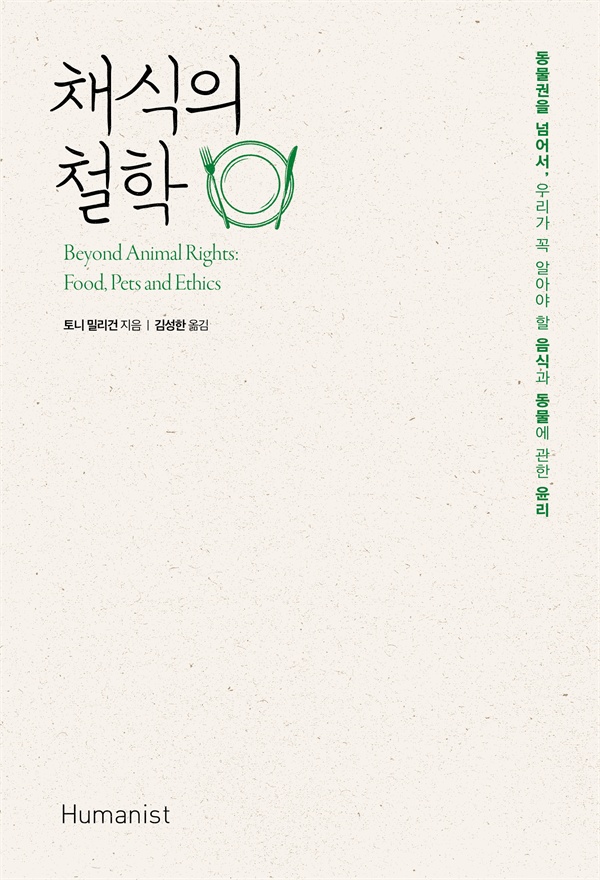
|
| ▲ <채식의 철학> 토니밀리건 지음 / 김성한 옮김 / 휴머니스트 / 1만6000원 |
| ⓒ 휴머니스트 | 관련사진보기 |
스코틀랜드 철학자 토니 밀리건은 <채식의 철학>을 통해 식습관 문제를 동물권이 아닌 인간 윤리 문제로 접근한다.
실제로 비건(고기는 물론 우유, 달걀도 먹지 않으며, 실크나 가죽같이 동물에게서 원료를 얻는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의 삶을 살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채식을 권하지도, 육식을 비판하지도 않는다. 윤리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답게 단순 양자택일의 차원이 아닌, 인간의 행동이 다양한 이유로 제약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채식의 철학>은 그동안 미뤄둔 문제를 책상 앞으로 가져온다. 딱딱한 규칙들로 구성된 논리학 서적보다 몰입감도 높다.
가축은 인간 덕분에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므로 마땅히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 '살아갈 기회 논증'이다. 이는 흔히 육식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되는데, 저자는 이를 다시 한 번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채식주의와 비건은 본능을 억제하는 금욕주의라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파한다.
이쯤 되면 채식주의를 적극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채식보다는 소규모 영농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채식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일부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도, 될 수도 없다는 주장을 칸트를 빌려 반박한다. 반려동물과 가축이라는 이분법의 기준은 먹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상품화에 있다는 주장도 흥미롭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민들은 소비자로 살아간다. 소비자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자와 공급자들은 효율적인 상품 생산방식을 만들어냈다. 방식이 이윤을 남기면 남길수록 음식 사슬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길어졌다.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해 살처분되고 땅에 묻힌 동물들이 뿜는 메탄가스는 기후변화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억울하게 생매장 당한 혼령들은 한을 품고 땅 위로 스멀스멀 올라온다. 여기에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축산 분뇨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대규모 축산은 얼마 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미세먼지에도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산업을 키워온 것은 인간들이다. 인간의 소비활동이 인간을 위협한다. 유튜브는 정보 접근성을 전보다 민주화했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기술력을 욕구 충족에만 사용할 줄 알게 됐다. 특정 생명의 살가죽이 벗겨지는 장면보다는 상품이 된 고기나 치킨을 먹는 영상 조회 수만 높아질 뿐이다.
저자 말처럼 모든 시민이 채식주의자가 돼야 할 필요는 없다. 반려인이라고 동물권에 필연적으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엄밀한 의미의 채식주의를 지향할 필요도 없다. 육식은 야만이고 채식은 윤리적이라는 태도 역시 지나치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에게 육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신의 식습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진부한 얘기라고들 말하지만, 진부한 얘기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하긴 쉽지 않다. <채식의 철학>은 조금 다른 의미의 '먹고 산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답을 내리는 건 독자의 몫이다.